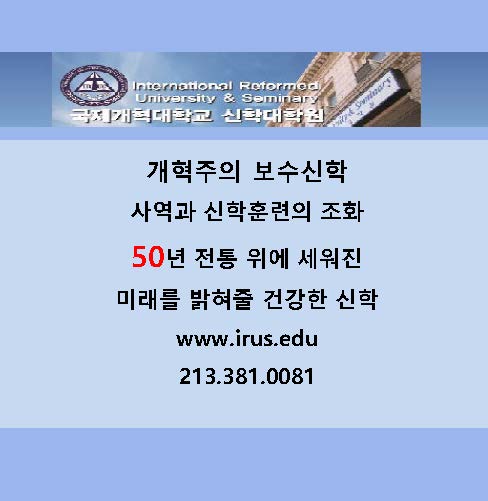세속 직업으로 생존문제 해결하는 것도 목사의 부끄럽지 않은 선택지
총회자립개발원 총신대학교 기독신문 공동주최로 1월 20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이중직 신학전문위원회 공개세미나 중 기조발제 ‘두 직업(소명) 목사의 정착 필요성’의 내용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목사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요구된다. 목사와 그 가정이 생존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더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될 수 없는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 즉, 목사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들의 현실적인 생존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단에 속한 1만2000여 개의 교회 중에 적어도 절반이 미래자립교회이며, 따라서 그러한 교회들의 목사들은 날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교단은 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의 생존을 목사 개인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교단은 미래자립교회 목사들의 생존을 위한 대안을 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미래자립교회의 목사들과 장차 교회개척을 꿈꾸는 목사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써, ‘두 직업 목사’(Bi-Vocational Pastor)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영어를 직역하여 ‘두 직업 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중직 목사, 겸직 목사, 자비량 목사, 전문직 목사, 또는 Tent-Making 목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 중에서도 ‘이중직 목사’라는 호칭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두 직업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중’이란 단어가 다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를 ‘두 직업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The Clergy Occupati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성직자가, 교회 밖 직장에서 전업(full time·일주일에 35~40시간)으로 일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20~25시간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필자는 두 직업 목사를 ‘자신의 목회적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활비 일부분이나 아니면 전체를 교회 밖 직업을 통해서 획득하는 목사’라고 다소 간단하게 정의한다. 정리하면 두 직업 목사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이수하고, 교단이 정한 절차를 거쳐 목사로 안수 받은 자가 생존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신학적 확신이나 목회적 소신에 의해서 목회직과 일반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목사를 의미한다.
즉, 목사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 직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는 두 직업 목사라 하겠다. 또한 목사 자신은 세속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이 일반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을 통한 수입이 목사의 생존 수단이 된다면 그 역시 두 직업 목사이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목사가 생존을 위해 택할 방법은 다양하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목사가 생존할 수 방법은 적어도 세 가지이다.
1)한 직업/전액 보조 목사(Single – Vocational/Fully Funded Pastor)
목사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다. 교회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목사의 생존을 완전히 책임지는 형태이다. ‘한 직업 목사’(Single-Vocational Pastor) 혹은 ‘전업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믿음 의존 목사(Faith Mission Pastor)
이 형태는 목사가 자신의 생존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소 신비적 방법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 필자는 ‘까마귀 의존 목사’라고 부른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의 공급으로 생존했던 것처럼(왕상 17:4~6),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한 양식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3)두 직업/부분 지원 목사(Bi-Vocational/ Partially Funded Pastor)
3)두 직업/부분 지원 목사(Bi-Vocational/ Partially Funded Pastor)
이 형태는 목사가 생존을 자신의 세속 직업에 의존하는 것이다. 교회가 목사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에, 세속의 직업을 가짐으로 생존을 해결하는 형태이다.
목사는 이상에서 논한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융합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해결한다. 물론 이 땅에서 목사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목회 형태는 없다. 그렇기에 전액 보조 목사 형태이든, 믿음 의존 목사 형태이든 아니면 두 직업 목사 형태이든 상관없이, 모든 형태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직업 목사는 결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에 관심이 지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먹고살기 위한 노동을 소명 차원에서 명령하셨다(창 3:17; 창 3:19; 딤전 5:8).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두 직업 목사나, 무료봉사 목사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직업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목사의 삶의 형태 중의 하나이다. 두 직업 목사는 ‘이류 목사’(Second-Class Pastor)나 싸구려 천박한 목회가 결코 아니다.
소명을 받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고정되고 획일적인 ‘목회 형태’(Ministerial Form)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각기 다른 상황의 목회현장으로 부르셔서, 각기 다른 형태의 목회를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목사가 처한 실존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목회 형태를 허용하신다. 따라서 목사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목회 형태를 찾아 자신만의 목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양현표 교수는 총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나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은혜한인장로교회를 개척해 담임했으며, 시카고 포도원장로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중직보다 나은 이름 없을까요
누군가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부르던 이름들은 오늘날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거나 객관화한 이름들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 그것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이름에도 그런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앤컴리서치에서 광주전남권역의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가 ‘이중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매우 거부감이 간다’는 의견이 34.5%,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반적 용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이중직 목회자’의 대안호칭으로 목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이름은 ‘자비량 목회자’(37.5%)였다. 비슷한 맥락의 이름인 ‘자립형 목회자’도 응답자 19.6%의 지지를 받았다. ‘일하는 목회자’(8%) ‘텐트 메이커’(8%) ‘일터 사역자’(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실 이 같은 호칭들은 해당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미 즐겨 사용되고 있다.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회자 1만4000여 명이 가입한 페이스북의 그룹 이름은 ‘일하는 목회자들’이고, 이 그룹을 운영하는 전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은 ‘일하는 목회자’를 분류하는 개념으로 ‘자발적 자비량’과 ‘비자발적 자비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중직’이라고 할 때 불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함께, 마치 목사의 다른 직업이 잘못되었다는 이미지를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중직’은 행정적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좀 더 친근한 개념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한다.
큰돈이 들어가는 일도, 무슨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일도 아닌데 이왕이면 그 대상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이름에 우리의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말이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