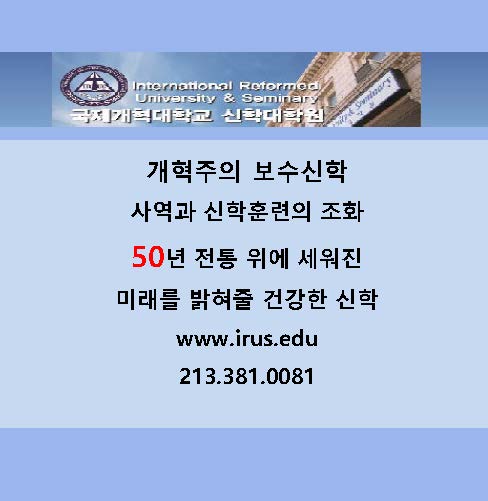한인 인구가 50명 내외인 동남부의 작은 도시, 초소형교회 부흥회 첫날이었다. 찬양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은 신이 나서 춤추듯 몸을 흔들었다. 담임목사님은 연신 싱글벙글했다.
찬송을 세곡쯤 신나게 인도하시던 담임목사님이 다음 찬송가를 알려 주시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부흥회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찬송을 몇 곡 더 불렀다. 신나게 찬양하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던 강사는 너무 너무 궁금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왔기에 저렇게 좋아할까?” 강사 체면이 뒤돌아 볼 수 없었다. 너무 궁금했다. ‘이 도시 한인들이 다 왔나? 아님 이웃 도시 성도들이 오셨나?’ 강사의 상상의 나래는 끝없이 펼쳐졌다. 드디어 찬송, 기도 끝나고 말씀 봉독도 끝나고 특별찬송도 끝났다.
강사는 마음이 급했다. 강사는 엉덩이를 반쯤 들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 더 한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강사는 조바심이 났다. 강단에 오르는 길이 멀었다. 큰 미국 교회의 강대상은 계단 높은 곳에 있었다. 강사는 강단에 설 때까지 회중석을 보지 못했다.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드디어 강대상에 선 강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1500여명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대형 교회 넓은 본당 예배실에 15명의 성도들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그냥 텅 빈 예배당 같았다. 자신의 교회의 새벽기도 성도들보다 더 적었다. 실망한 강사는 목이 잠기는 듯 했지만 마음도 목도 가다듬고 설교를 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환한 미소로 찬양하며 거듭 거듭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담임 목사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행복한 담임 목사님 얼굴과 텅 빈 예배당이 눈앞에서 교차되었다.
강사는 그 날부터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훌륭한 진짜 목사님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15명의 성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 행복한 후배 목사님이 최근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회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낸 것이다. 그 목사님은 여전히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나무는 만족과 감사를 먹고 자란다. 만족과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에 더 큰 축복이 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이 없다. 오늘의 삶에 만족함이 행복이다. 감사가 행복이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해서 행복을 놓친다.
범사를 행복의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주변에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꾼들이 많다.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이다. 모든 상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 천재들이다. 오늘도 열악한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 행복한 목사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