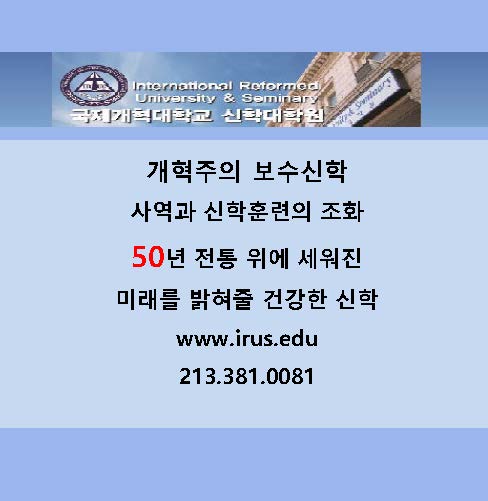9월입니다. 9월의 시(詩)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광수 시인은 “9월이 만들어놓은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에서” 사랑의 손을 잡자고 했습니다. 이외수는 “기다림은 사랑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밀려든다”라고 했습니다. 정헌영은 “스미는 가을빛에 사랑은 알밤처럼 익어가고, 가을빛 노을보다 더 붉은 여린 가슴만 쥐어뜯는다.”라고 했습니다.
9월의 첫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월을 도둑맞은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세월을 사랑하지 못했음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 목필균은 9월을 생각하며 “날마다 짧아지는 해 따라 바삭바삭 하루가 말라간다”고 했습니다. 무심하게 떠나가는 세월의 뒷모습에 애타하는 그리움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월이 좀먹냐?”라고 가지 않는 시간을 탓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속절없는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지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9월의 첫 주일만 오면 오금이 저리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한 것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넘어졌지만 도와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다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생각, 후회막급에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심에 찬송을 불러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9월입니다.
9월의 첫 주일,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날이 서부장로교회에 부임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날이 오면 몸 둘 바를 몰랐는데,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다닌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어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주의 자비와 용서,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9월에 사랑의 시 한 편을 마음에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시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