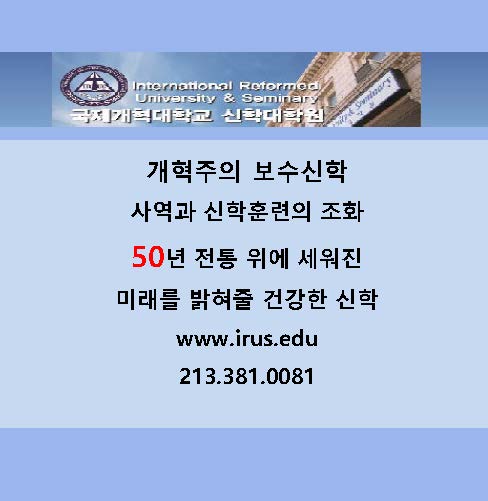아나톨 프랑스의 “성모 마리아의 곡예사”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는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을 책과 더불어 보낸 프랑스 작가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프랑스 작가 자크 아나톨 프랑수아 티보(Jacques Anatole François Thibault)의 필명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중학교 졸업 후 ‘황금 시집’을 발표하며 시작활동으로 문단에 등장하였으나 그 후에는 소설과 비평에 집중합니다. 그는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그리스, 라틴, 프랑스의 고전을 읽고 비평하며 인간과 종교에 대한 풍자를 하는 비평가요 소설가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광신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유럽사회를 지배한 천주교의 모순과 비리를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도와 문학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1921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실베스트르 보나르의 죄’(1881), ‘타이스’(1890), ‘붉은 백합’(1894), ‘신들은 목마르다’(1912)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종교와 인생의 본질을 찾는 통찰력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나톨 프랑스의 풍자소설 중에 잘 알려진 ‘성모 마리아의 곡예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프랑스 루이왕 시대에 ‘바르나베’라는 무명 곡예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장터에서 사람들만 있으면 낡은 양탄자를 깔고 온갖 묘기를 선보이는 성실한 곡예사였습니다. 선배 곡예사로부터 물려받은 익살스러운 만담을 오랫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재주를 부렸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묘기를 보이다가도 때가 되면 언제나 성당을 찾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따뜻하게 감싸 줄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온 종일 비가 내려 재주를 부릴 수 없었던 날, 재주 부리는 도구들을 싸서 팔 밑에 끼고 맥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날이라 저녁도 먹지 못한 불쌍한 곡예사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으며 맘으로 걷다가 한 신부를 만납니다. 공손히 인사를 건넨 그는 신부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 시장기도 잊은 채 따라 걸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바르나베 곡예사는 신부에게 말을 겁니다. “신부님! 저도 신부님처럼 날마다 미사를 드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치겠습니다.” 그의 진실한 고백에 감동된 신부가 “형제여! 나와 함께 가세! 내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 가세! 자네를 수도사로 받아 주겠네.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대에게 인도하신 것일세!” 이렇게 해서 곡예사 바르나베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모리스’라는 수사는 능숙한 솜씨로 가죽에 성구를 새기고, 몇몇 수사들은 성화를 그렸고, 또 몇몇 수사들은 돌로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르나베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한없이 한탄했습니다.
그의 한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은 단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었고, 미사곡도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도원 뜰 채소밭을 가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읽기도, 성가 부르기도, 운율 기도도 못합니다. 성화 작업, 성상 작업도 못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바르나베는 드디어 원장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원장님,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곧 성탄절인데, 무엇으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수도원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세요, 당신이 드리는 최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날부터 바르나베는 주님께 드릴 ‘최선’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바르나베는 수도원 구석 작은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바르나베의 수상한 행동이 수도원의 화제였습니다. 궁금증이 극에 달한 수도원장이 어느 날 밤 몇 명의 신부들과 바르나베가 들어간 예배당 창문에서 그를 엿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바르나베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악한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신을 다해 재주를 보이고 탈진해 쓰러진 바르나베에게 벽에 서 있던 성모상이 성큼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옷자락으로 바르나베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수도원원장과 신부들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다 보셨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베르나베의 곡예를 하나님(성모)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천주교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당, 수도원, 소도사, 신부등이 주요 인물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나아가 성모 마리아상을 대상으로 예배행위가 등장하고 성모 마리아상을 의인화 하고,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바르나베의 헌신과 충성을 인정해 주는 다소 지나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Protestant)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주요 메시지는 기독교적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루며 직업 프로테스탄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직업 소명론을 다룹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거룩한 일도 세속적인 일도 다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성직자로 추앙하고 성과 속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당시 천주교 문화에서 이런 세련된 작품이 잉태된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만큼 아나톨 프랑스가 성숙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그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을 보여 줍니다.
필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삼류 마술사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글을 바칩니다. 오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농촌과 어촌 벽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회자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글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흐른 땀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곡예사들입니다.